기사상세페이지
- 나에게 그림은 종교입니다 -
여수에는 오동도가 있고 그 곳에는 어김없이 겨울 꽃 동백이 있다.
그리고 동백꽃의 작가 강종열이 있다.
그리고 동백꽃의 작가 강종열이 있다.
그는 40년이 넘은 화력을 지닌 국내의 중견작가로서 지금은 동백꽃작가로 한국화단에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동백꽃의 매력에 빠지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꽃을 그리는 작가는 눈여겨보지 않았을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백꽃작가로 자리매김 되어 여수의 든든한 예술적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3500호에 달하는 스케일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흔히 21세기 인상주의를 표방하는 이 동백작품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동백과 함께한 의미체험의 시간에 주목하게 된다. 그가 동백의 원형적 인상과 호흡을 잡아내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동백 군락지란 군락지는 다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숱한 발품으로 동백과 소통했고 그 소통의 결실이 바로 작품 속에 담아 둔 원형적 인상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 정성껏 다가갈 때 대상도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강종열은 오랜 체험에서 터득하고 있다.

한 잎 날아 한 잎의 호흡으로
겨울 언저리가 뜨겁다
칼바람도 허공도 고독도 눈발도 마침내 핀다
그래 그래 그 맘 잘 알아
그래 그래 다 알아
견뎌낸 그 맘 붉어 더 뜨거운
그게 아마 꽃이었어
하늘이 하늘 답고
땅이 땅 다운
그게 아마, 꽃의 단단한 기억이었어 - 신병은 <동백꽃 피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수없이 피고 지는 동백의 숨소리를 듣는다.
피는 것도 고요, 지는 것도 고요라는 것, 고요는 결국 시간의 깊이임을 알게 된다.
춥고 바람 부는 시간의 견딤임을 알게 된다.
그 깊이와 견딤 속에 오랜 원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공존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숨 막힐 듯한 원형적 고요와 정적, 원형적인 빛과 어둠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어디서 저런 당당하고 저력 있는 호흡이 나오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대상을 마주하고 응시하는 힘이 나올까를 의심하게 된다.
그를 통해 응시의 힘이 곧 재발견의 힘임을 확인한다.
그는 생명의 원형적 통찰을 통해 얻게 되는 사유의 힘으로 그림이 종교라는 자기철학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질 좋은 창작은 신기한 것 보다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오랜 응시에서 비롯된다고 귀띔해 준다.
그는 늘 자신의 그림은 종교와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만의 작업을 하라고,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남을 흉내 내지 말고 삶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 그의 동백은 우리가 늘 보던 동백이면서도, 늘 보던 그 동백이 아니라 그만의 의미체험과 상상력으로 풀어낸 동백이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또 다른 익숙한 것과의 재회, ‘낯설다’와 ‘익숙하다’의 경계가 선명한 그림이다.
색채의 은근한 하모니, 형태를 단순화하고 따로 놀던 색채를 통합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 깊어지면서 사소한 디테일이 사라지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이 퇴장하면서 마침내 그림이 남게 된다. 대상은 위대해지고 하나의 거대한 합집합체가 되어 캔버스를 채운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온 생명으로 동백그림이 자리하게 된다.
그림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과 시의 해설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여행이 아닌 암행인 셈이다. 깊은 내면적 통찰이 없이는 새로운 의미체험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에 대한 조망과 총체적 사고가 없이는 작품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묻고 들춰보는 호기심과 의심이 창작의 동력이다.
그래서 그림은 기교적인 완성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 좋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사유의 개입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강종열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시를 만나고 원형질의 호흡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신화적 의미체험을 한다.
좋은 그림에는 좋은 시가 담겨 있고, 좋은 시에는 좋은 그림이 안겨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림 속에 숨겨둔 시, 세상과의 소통법을 눈여겨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먼 곳에 있는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원형적 자아를 만나고 현재의 나를 세상과 화해시켜 준다.
어떻게 견뎌낸 외로움인데
어떻게 다독여온 아픔인데
어떻게 열어놓은 설레임인데
어떻게 펼쳐놓은 그리움인데
혼자 깊어지다
뚝
뚝
저를 놓아버리는 단음절 첫말이
이렇게 뜨거운데
설마 설마
이게 한순간일라구 -신병은 <동백꽃 지다>
좋은 그림은 세상 모든 사람과 통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런 작품이라면 얼마나 넓고 깊은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의 조형언어는 바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이 내품는 메시지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고 자연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자연 언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수평적 관계의 언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총체적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 즉 관계성의 언어를 중시한다.
저렇게 함께 하나의 온 생명으로 조화를 이룰 때 낱 생명 또한 우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의 언어는 그래서 자연과 일치될 수 있는 길이 되고, 새와 꽃의 속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작품 속에 안착하게 된다.
그 힘의 근원은 자연과 하나 되는 조형언어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풍경이 곧 그림이자 시다.
그림은 풍경 속 풍경을 보는 것이면서 풍경 속 시를 보는 것이다.
풍경체험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든 풍경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옮겨놓는 작업이고, 마음의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게 바로 이미지와 형상화다.
그래서 강종열 화백의 그림 앞에 서면 문정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런 질문을 만나는 것이다.
아, 나는 또 어디를 다녀와야 겨울 속 단단한 꽃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그림은 꽃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에 관한 질문이다.
꽃한송이를 피우는 일이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협주곡이라 한다면 저 깊은 동백의 시간과 공간속에 내 가 펼쳐놓은 한호흡은 어디쯤 숨어 있는 걸까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눈 속에 떨어진 그의 동백꽃을 바라보면 취할 수 있는 것도 용기지만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더 큰 용기임을 당당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동백이 가장 눈부신 꽃이라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의 화법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꽃을 이해하고 나무를 이해하는 일이 결국은 생명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임을 아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 원형적 생명과 호흡력에 기대어 숨이 턱턱 막히면서 가슴 또한 벅차올라 윙윙거리며 그의 내밀한 울림을 향해 날아들게 된다.
신병은(시인, 미술평론)

















![[여수 역사 달력] 11월 21일의 여수](http://ysibtv.co.kr/data/file/news/thumb/thumb-2039860691_3nvbq76o_c85b662afc1ddf9116bbde554657ffcc278ad355_340x24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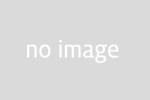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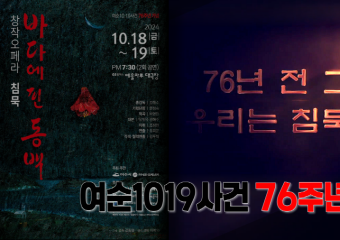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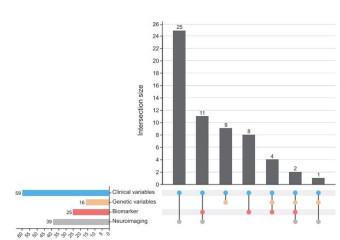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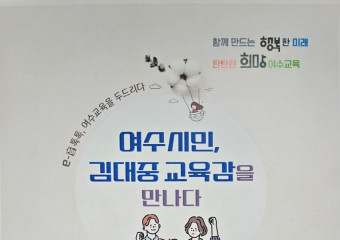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