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나를 그립게 만드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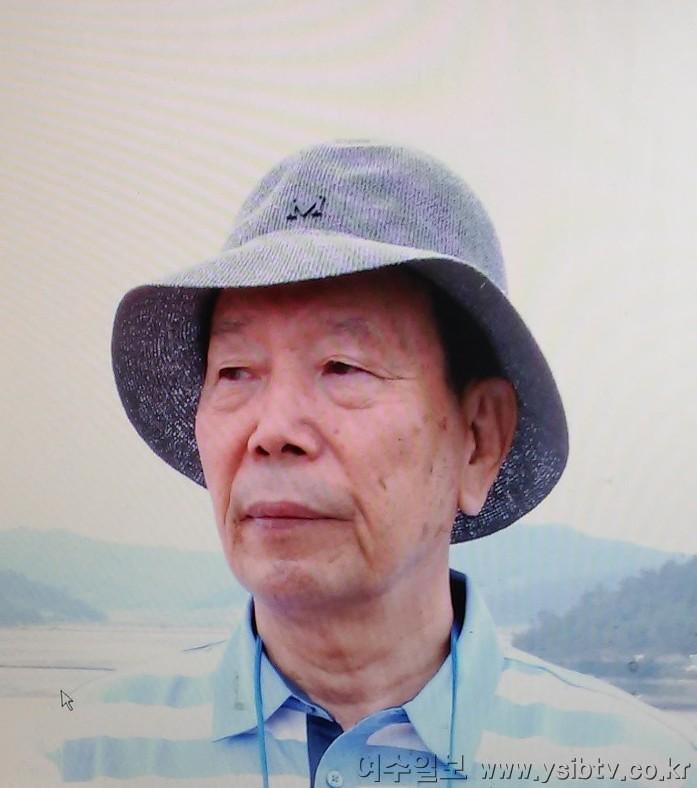
임병식 수필가
나는 거문도를 생각하면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는 말. 이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치는 것인가. 거문도는 정말이지 나를 그립게 만드는 섬이 아닌가 한다. 아름다운 풍광 못지않게 늘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환희와 절망이 함께 뒤엉켜 혼재 하는 인상 때문일까.
거문도는 육지로 부터 무려 134.7km나 떨어져 있는 섬이다. 형상은 세 개의 섬이 마치 소쿠리 형태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감싸고 있다. 그런지라 제아무리 풍파가 거세도 끄떡없는 천혜의 포구를 자랑한다. 이 섬은 조업하는 선박들의 대피장소이면서 선원들의 휴식처이다. 풍랑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내리면 국내 선박뿐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타국적의 배들이 예외 없이 몰려든다.
섬의 모양은 본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섬이 무려 33개나 아우러져 있다. 그런 만큼 바다에 떠있는 진주와도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통상 섬은 한자로 도서(島嶼)로 표기한다. 도(島)도 섬도자이고, 서(嶼)도 섬서자이니 각각 따로 부를 법도 하지만 외자로 떼어서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옛 문헌에 보면 ‘도’와 ‘서’는 엄연히 다르게 나와 있다. 즉, 도(島)는 해중유릉가거(海中有陵可居)라 하여 사람이 사는 것을 일컫고, 서(嶼)는 재수위(在水爲) 혹은 (재릉위(在陵爲)라고 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이른다.
아무튼 이 외딴 섬 거문도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세게 열강의 입김에 시달려왔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근대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맞서 영국군이 진주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문도는 그 지명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세기 청나라 제독 정여창이 이 섬에 와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문장가가 많다’는 뜻으로 <巨文>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섬은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영국군은 23개월여를 주둔하면서 포트 헤밀턴( PORT HANILTON) 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 흔적을 남겼다. 이때 죽은 병사를 이곳에 묻고 묘비를 세웠다.
이 섬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설치된 유물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뭐냐하면 서도 수월산에 있는 등대로 1905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역사로 볼 때 인천 팔미도 등대에 이어 두 번 째로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세운 목적은 일제가 배를 이용해 수탈할 목적으로 방향잡이용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듯 거문도는 우리의 영토이면서도 늘 외떨어져 있어 외세에 시달려온 아픈 역사를 간직한 것이다.
나는 1971년 발령을 받아 이 섬에 부임했다. 그런데 부임하고 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구사하는 사투리는 물론 생활의 패턴이 내가 자란 곳과 많이 달랐다. 밀물과 썰물, 조금과 시라, 여객선 입항과 출항에 따라 모든 생활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니 사람들의 행동은 일사불란하기만 했다.
한데도,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마주친 풍광이 아름다워서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한꺼풀 속살을 비집고 들어가면 침략의 흔적이 오롯이 나타났다. 다음은 그런 느낌을 받고 써본 자작시이다.
거문도에 가면 외세가 훓고간
바람이 분다.
1905년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등대,
누가 불러들이지도 않았는데도 군인들이 몰려와
숨져간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백도는 지금도 그 상처에 자지러져 아파 한다
하지만 나중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처음 대해본 거문도의 비경은 실로 일품이었다. 마치 풍광이 그림 같고 드러내는 모습들은 이국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은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타고오던 삼산호가 어찌나 거친 파도에 요동을 치든지 반 주검이 되고 말았었다.
손죽도와 초도사이는 예로부터 악명이 높아 극심한 삼각파도가 배전을 강타라도 하면 좌우상하로 흔들려서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 바람에 승객들은 체면불고하고 서로 뒤엉켜 비명을 지르지 나뒹굴어 졌다. 그러니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거문도에 도착하니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바람은 잦아들고 파도는 잔잔했다. 다만 항내에 가득 찬 선박들만이 태풍의 전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발이 묶인 배들은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도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웃 섬을 건너뛰어 갈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거문도에 와서 진정으로 절경을 실감한 건 백도이다. 관광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에 나는 그곳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었다. 그 황홀한 아름다운 절경이라니... 그 감동은 이어지는 후반부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꼭꼭 싸매서 숨겨둔 섬
백도는 범접하기 어려운 신이 노니는 섬.
그 기기묘묘한 수직절리
타고 오를 자는진정 없으리.
한데 그때가 언제인가 . 내가 거문도에서 새 출발의 첫발을 내디 딘 지도 벌써 수 십 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모습도 많이 변했다.삼도로 나뉘어 있던 섬은 다리가 놓여 연결되었고, 옛 등대는 수명을 다하고 유물로 남겨졌다. 그리고 백도에는 찾아오는 관람객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나는 거문도를 떠올리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도로를 낸답시고 옛 소롯길을 훼손하고 말았는데, 그 바람에 옛길이 사라져 버려서다. 예전의 그 길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덕촌에서 변촌을 지나 서도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벼룻길은 너무나 아름다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모르게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숲길, 수줍게 피어난 동백꽃이 이마에 나직하게 닿던 정겨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오랜 세월 지났지만 '아, 옛날이여'하는 아쉬운 생각이 절로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