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혹여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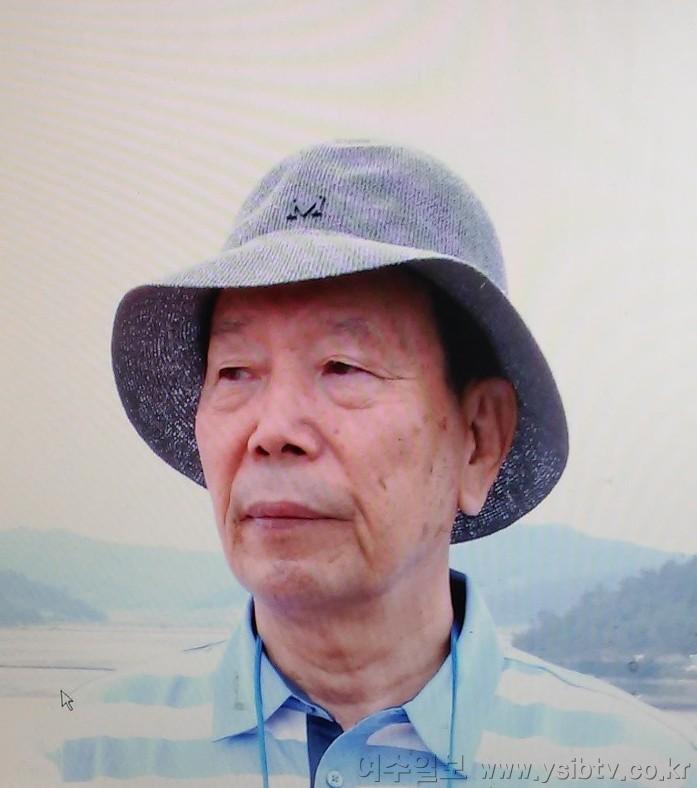
수필가 임병식
3월은 동백꽃의 계절이고 여수는 동백꽃의 고장이다. 여수에 사는 사람치고 동백나무와 동백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여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 소리를 연상하면 어떨까 싶다.
감나무에 매달린 감또개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그 낙하음을 -.
만약 곱디고운 동백꽃이 별안간에 떨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정황을 연상해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혹자는 이렇듯 홀연히 지는 동백꽃을 두고 마지막까지 시들지 않고 뭉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여느 꽃보다 얼마나 결연하며 장엄한가.
동백꽃은 이른 봄에 꽃이 핀다. 수종은 실록교목으로 차나무과에 속하며 이파리는 두텁다. 수정은 이른 봄에 피는 만큼 벌과 나비가 역할을 못한 대신 동박새가 한다. 꿀을 내어주는 대신 녀석에게 수정을 의탁한다. 동백꽃은 매력적인 꽃이다. 매화만큼이나 고고하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청순한 기개를 보여준다.
내가 이런 동백꽃을 많이 보게 된 것은 여수에 와서이다. 이른 봄 날 직장 따라 여수에 와서 보니 가장 인상적인 것이 동백꽃이었다. 시간을 내어 오동도를 들렸는데 아기자기한 동산이 온통 동백꽃의 천지였다. 절로 강한 인상이 박혀 버렸다.
그만큼 동백꽃은 여수를 상징하고 여수라면 어디서든 동백나무를 볼 수 있다. 개화시기도 한여름을 빼면 다양한 수종이 꽃을 피운다. 그러니 일부러 멀리 나가 발품 팔지 않아도 시 외곽을 조금만 벗어나면 쉽게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동백꽃 중에는 오동도의 것이 일품이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늘 꽃을 피우고 있어 찾아가면 언제든 반긴다. 나는 이런 동백 숲속이 좋아서 동백 숲을 거닐면서 자작시를 읊조리곤 한다.
오동도 동백꽃 붉은 동백꽃 /지아비 그리다 떨어져 죽은 자리에/ 혼령으로 피어난 서러운 넋아/ 네 피어
난 뜻 그 누군들 모르랴/ 푸른 잎 붉은 입술 차마 보기 애처러워 / 보는 사람마다 고개 떨구누나./

옛날 옛적에 오동도에는 고기잡이 지아비와 한 아낙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남편이 고기를 잡이 나간 사이 도적떼가 침입 하여 여인을 덮치려고 했다. 그러자 여인은 얼른 벼랑 끝으로 몸을 숨겼다. 그래도 따라오자 아낙은 결심을 했다.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자고. 해서 아낙은 뛰어내렸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하였다.
나중 고기잡이 나갔다 돌아온 남편은 시신을 수습하여 바위틈에 무덤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에서 동백나무가 자라났고 그 주위에는 푸른 신우대가 자라났다.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애절한 사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오동도 동백꽃은 해마다 유독 붉디붉은 동백꽃이 피어낸다. 마치,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사랑 할까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는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백여 년 전, 내세의 만남을 기약하며 죽은 남편의 관속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미투리를 삼아 넣었던 안동의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여인의 편지처럼 그렇게 오동도의 동백꽃도 죽은 여인의 혼령인냥 해마다 애련하게 피어난다.
오동도의 동백꽃은 조금은 독특하다. 가령, 돌산 은적암(隱寂庵)의 동백이나 향일암의 꽃과는 달리 그 품위가 우월하다. 은적암의 꽃이 꽃술이 다문다문 피어 은근한 그리움을 자극한다면, 향일암의 동백꽃이 인파가 북적거리는 가운데 피어선지 정숙한 맛이 없다. 하지만 오동도 동백꽃은 여간 순결히 보이지 않다. 꽃술은 영롱하고 이 산"뜻하며 어떤 비장미를 보여준다.
결코 선운사 동백을 두고 서정주 시인이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 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디다..."와 같은 그런 분위가기 아니다. 천박하게 입술 짙게 화장한 그런 목로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해풍을 맞고 피어서인지 청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
해서 나는 종종 오동도를 찾는다. 피어있는 자태가 매혹적이어 서다. 나는 예전부터 동백꽃을 좋아했다. 그런 이유가 있다. 내륙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큰댁 마당에는 보기 드물게 수령이 백년도 넘은 동백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동백나무는 겨울철만 되면 온 가지에 불을 켜듯 붉은 동백꽃이 피어냈다. 그게 좋아서 유년시절에는 나무 밑에 가서 이파리를 따 딱지치기를 하고, 떨어진 꽃송이를 주워 지푸라기에 꿰어서는 인디안 무희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
그밖에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결혼식을 올리는 초례청(醮禮廳)에는 으레 동백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꽃이 핀 것은 그대로 쓰고 아직 꽃이 안 피면 대신 조화를 매달았다. 그것을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집례자가 '신부出'을 외치면 그 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어 꺾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동백꽃을 생각하면 노래 어느 가사에 나오는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을 가니...' 하는 대목처럼 추억을 더듬어 동백꽃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자작시를 읊조린다.
물빛도 고운 고장 동백의 고장 / 오동도 동백꽃은 붉기도 해라./터지는 꽃술에 서린 그 절개/ 오래토록 기억될 정절이어라./ 나그네 옷깃 여미게 하는 정령이어라.
지금은 봄기운이 한창이다. 이 때면 오동도는 온통 붉게 피어난 동백꽃으로 성찬을 펼친다. 추억거리가 그리운 사람, 아니 젋은 연인끼리나, 함께 살아 살가운 정이 그리운 사람은 한번쯤 와서 걸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 오동도 동백꽃은 해풍에 맑게 얼굴을 씻고 찾아온 이를 반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2000년)
임병식.
1989한국수필로 <천생연분>으로 등단. 여수문인협회지부장 역임. 한국수필작가회장 역임
한국수필가 협회 공영이사 역임 수필집‘지난세월 한 허리를’외 다수
